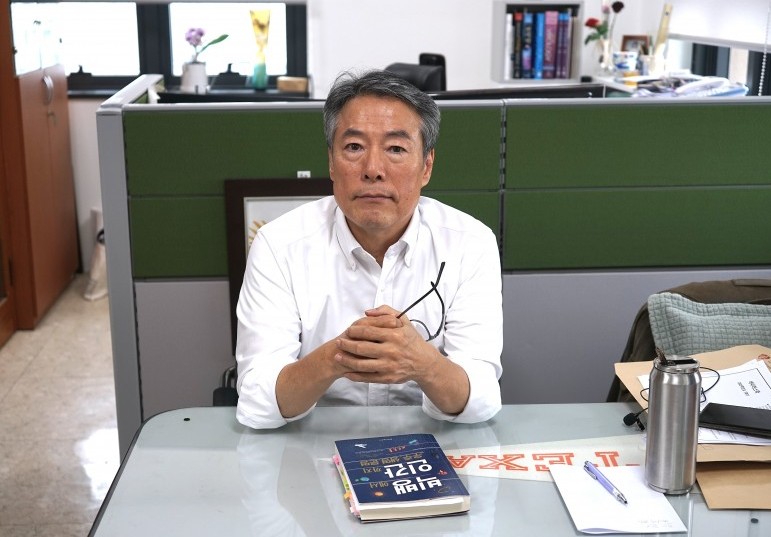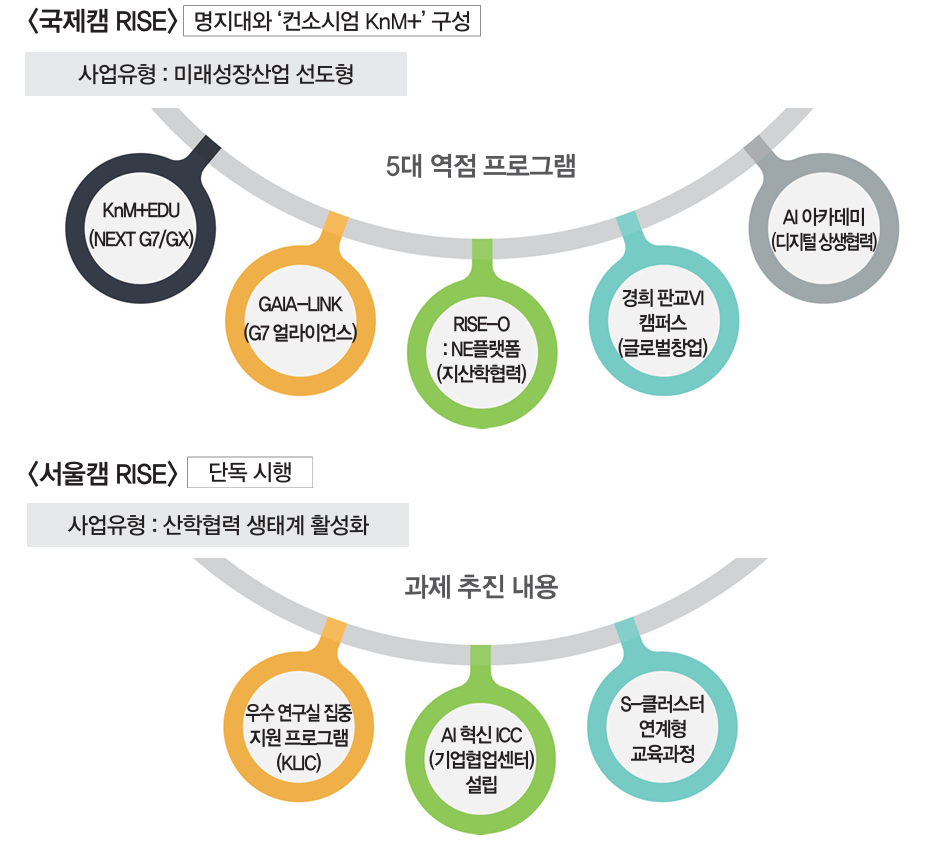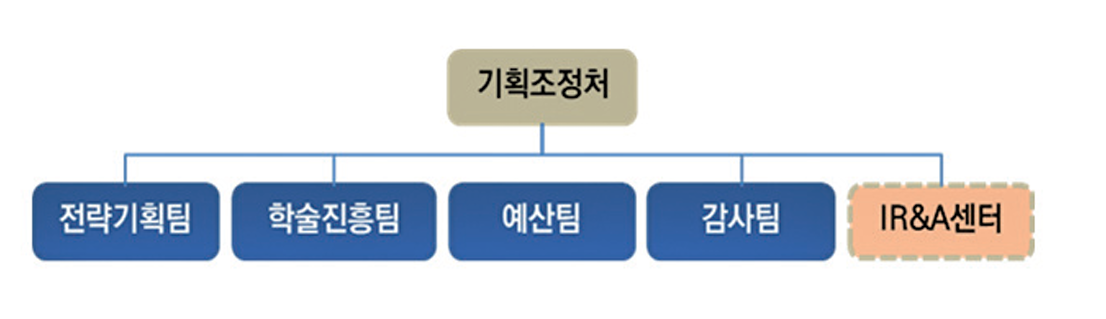며칠 전 인터넷에 올라온 인천 계양산 사진은 공포 그 자체였다. 산을 뒤덮어 까맣게 물결치는 러브버그(붉은등우단털파리) 때문이다. 지난 몇 주간 한국은 러브버그로 난리였다. 사람을 물지도 않고 병을 옮기지도 않는다지만, 둘씩 짝지어 비행하는 꼴을 보면 불쾌하기 짝이 없다. 실제로 지난해만 러브버그 방제 민원은 약 9천 건이었다.
러브버그는 따뜻하고 습한 기후를 좋아한다. 10년 전만 해도 한국에서 보기 어려웠던 러브버그는 대벌레, 깔따구에 이어 곤충 대발생의 주인공이 됐다. 학자들은 원인이 생태계 변화와 기온 상승이라고 설명한다. 인공 숲을 조성하고, 도시 열섬 현상으로 출현한 특정 종이 천적 없이 과번식을 하게 됐다는 것이다. 즉, 러브버그는 기후 위기라는 큰 틀 안에서 이해할 문제다.
그런데 러브버그가 한창이라는 소식에 한 기초단체장은 시민에게 “좀 참을 줄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어련히 참고 살아온 시민 입장에선 공직자들의 책임 회피 발언으로밖에 이해하기 어렵다. 시민 불편에 조금만 관심을 가진 공직자였다면, 이 현상은 기후의 관점에서 이해했을 테다. 따라서 ‘참는다’는 회피보다 정책적 대응 방안을 먼저 내놓았어야 했다.
러브버그는 참아서 해결할 사안은 아니다. 거대한 위기의 작은 신호다. 작은 곤충의 일탈로만 바라보면 안 된다. 단순 방제로 끝낼 문제가 아니다. 어떻게 보면 러브버그도 생태 환경이 변했기에 서식지를 옮긴 것뿐이다. 참새가 러브버그를 먹어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는 문제 해결을 자연에게 온전히 맡겨도 되는지 의문스럽다. 기후 위기라는 거대한 과제를 풀어낼 꾸준한 연구와, 미래세대를 위한 장기적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
결혼비행을 마친 러브버그는 곧 자취를 감추겠지만, 앞으로 더 낯설고 거대한 불청객이 우리 앞에 나타날지도 모른다. 그때도 좀 참고 넘길 수만은 없을 것이다. 러브버그가 지구를 대신해 우리에게 묻고 있다. 기후 위기 신호를 못 본 체 넘기고 방역에만 급급할 건지, 아니면 현상의 본질을 짚고 생태계 복원을 위해 힘쓸 것인지. 미래세대와 지구를 ‘사랑’하는 선택이 필요해 보인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1
- 2
- 3
- 4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