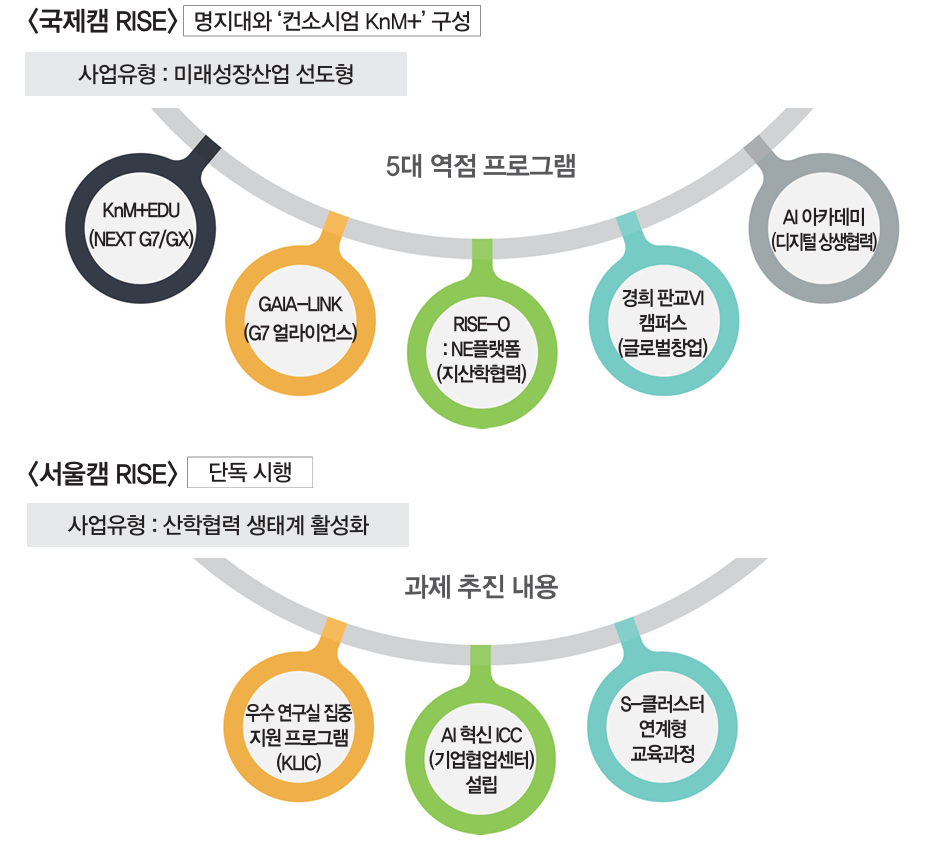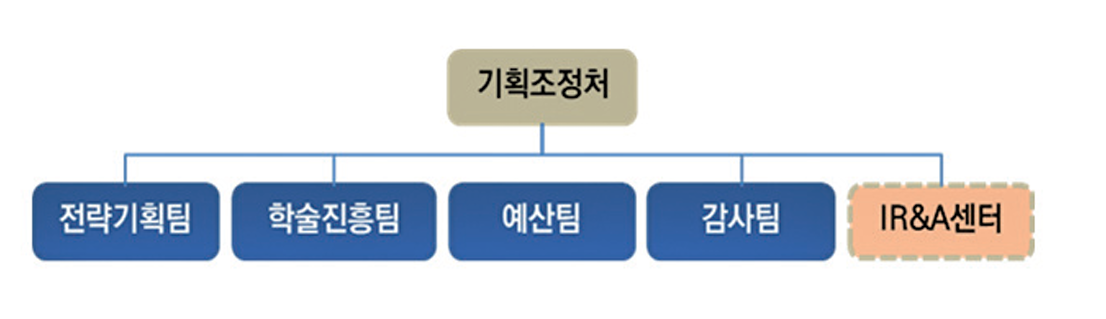[사람] [창간 70주년-나는 주간교수다⑤] 언론학 교수처럼 “기계적 중립, 그건 최소한” 선배기자처럼 “열정 없으면 기자하지 마라”
창간 70주년
나는 주간교수다⑤ - 한균태(신문방송학·2000.01~2002.02 주간)
# 창간 70주년을 맞아 대학주보는 역대 주간 교수를 만나 그들이 겪은 대학과 사회의 현실, 덜 다듬어진 학생기자들을 어루만져온 그 시간을 들어보았다. 다섯 번째 순서는 역대 주간 중 유일하게 주간교수와 발행인(총장)을 역임했던 한균태 전 주간의 이야기다.
해직 기자 출신 주간
‘기계적 중립’ 강조하기도
1970년대 말, 한균태(신문방송학) 교수는 신문 기자 생활을 시작했다. 하지만 자유 언론을 외치며 목소리를 낸 대가는 가혹했다. 입사 2년 만에 ‘해직기자’ 신분으로 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신문방송국 주간교수를 맡아달라는 제안에 “다소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한 교수는 가슴 한 켠 깊숙이 묻어두었던 해직기자로서의 아픔과 언론학자로서의 기대감이 동시에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현장에 다시 돌아와 이론적 지식을 접목시켜 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다.
때로는 언론학 교수처럼, 또 때로는 현장 경험이 풍부한 선배 기자처럼 한 교수는 대학주보 기자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렸다. 편집실에서는 아이디어 회의를 독려하며 편집장과 수시로 소통했고, 조판 후 술자리에 항상 참석하는 보기 드문 주간이었다. 동시에 언론학자로서 기사에 담겨야 할 최소한의 윤리와 형식을 중시했다.
한 교수는 “기사를 쓸 때 ‘정성적 중립’을 지키는 것은 학생 기자들이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신 ‘기계적 중립’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학교와 학생 측의 입장을 가급적 균형 있게 담도록 지도했고, 기사에서 감정을 암시하는 형용사는 최대한 덜어내도록 했다.
해직되기 전 3개월은 교열부에 있었던 탓에 그 습관이 대학주보 조판 현장에서 그대로 드러나기도 했다. 한 교수는 빨간펜을 들고 기사 하나하나를 뜯어보며, 사실 관계와 논조를 끝까지 따졌다. 48기 강금영(사회과학부 1999)은 “워낙 꼼꼼하셨던 탓에 조판소에서도 취재수첩을 뒤적이며 몇 번이고 다시 확인하곤 했었다”며 “제 2000년에 꼭 필요한 '미워할 수 없는 악역'같은 분”이라고 전했다. 49기 김수성(언론정보학 2000)은 “스물몇 살 즈음의 청춘이어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당연히 있었고, 타협하지 못하고 싸우면서 속상했던 감정이 슬그머니 피어오를 때도 있었다”며 “줄다리기가 많았지만, 결국 열에 일고여덟은 못 이기는 척 신문을 허락하셨다”고 떠올렸다.

▲ 한 교수는 편집실에서는 아이디어 회의를 독려하며 편집장과 수시로 소통했고, 조판 후 술자리에 항상 참석하는 보기 드문 주간이었다. (사진=이지수 기자)
날 것의 반응
기대했던 ‘현장의 감각’
툭하면 협조전을 내미는 기자들에게 “수업과 병행할 수 있는 의지나 열정이 없으면 기자하지 마라”고 호통치곤 했지만, 47기 이승재(서양어학부 1998)의 기억처럼 한 교수는 “학생 기자들이 고생하는 점을 인정하며 학교 측의 많은 지원을 이끌어낸 주간”이었다. 당시 편집장이던 47기 김주애(지리학 1998)가 총장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IMF 여파로 끊긴 해외 연수를 다시 추진해 달라”고 과감히 건의하자, 옆에 있던 한 교수가 “방학도 없이 취재하는 학생 기자들에게 그만한 자격이 있다”고 강력히 힘을 보탰다. 그 한마디는 여름방학 일본 탐방을 시작으로, 이듬해 중국 기행과 실크로드 탐방 등 수많은 해외 취재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됐다. 학생기자들이 현장에서 직접 담아 온 생생한 취재 내용은 르포 형식으로 지면에 실렸고, 대학주보는 한층 넓어진 시야로 독자들과 만날 수 있었다.
한 교수는 “그 당시에도 학생운동은 있었다”며 주간 시절 또렷이 기억에 남는 사건 하나를 소개하기도 했다. 지금은 사설을 편집장이 도맡지만, 당시에는 주간과 편집장이 번갈아가며 사설을 쓰던 때였다. 어느 날 한 교수가 ‘명분 없는 학생 시위’를 주제로 비판적인 사설을 썼는데 그게 기폭제가 됐다. 며칠 뒤 정경대 앞에는 “조선일보와 같은 대학주보, 죽창을 들고 무찌르자!” 현수막이 나부끼고 있었다. 정경대 학생회장이자 신문방송학과 학생이 직접 붙인 것이었다. 섬뜩하기도 우스꽝스럽기도 한 저 문장은 당시에도 꽤나 격앙된 표현이었다.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에게 공개적으로 비난을 받았지만 한 교수는 날 것의 반응조차 대학주보가 여전히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여겼다. 주간직을 제안받으며 기대했던 ‘현장의 감각’이었다.
총장이 된 주간교수
위치가 바꾼 시각
시간이 흘러 2019년 12월, 한균태 교수는 경희대학교 역사상 처음으로 구성원들의 직접 추천을 통해 선출된 총장이 됐다. 매주 월요일 아침마다 이제는 ‘발행인’의 입장으로 대학주보 지면을 읽게 됐다. 역대 주간교수 중 두 역할을 모두 경험한 이는 한균태 전 주간뿐이다. 이에 대해 “대학을 운영하는 총장의 시각과 학보를 이끄는 주간 교수의 시각은 확실히 달랐다”는 짧지만 깊은 소회를 남겼다.
주간 교수 시절에는 학교와 학생 사이에서 일종의 ‘줄타기’를 해야 했다. 기자들의 질문은 뾰족했고, 학교는 종종 불편해했다. 그 사이에서 균형을 조율하는 일이 주간 교수의 몫이었다. 반면, 대외적으로 대학을 알리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야 하는 총장의 자리에서는 자연스레 ‘좋은 뉴스’에 더 많이 눈이 갔다. 하루는 <대학주보의 가치는 폄하될 수 없다>는 제목으로 대학 본부를 비판하는 사설이 지면에 실렸다. 한 교수가 주간교수와 편집장을 따로 불러 말했다. “‘폄하될 수 없다’보다는 ‘가치는 존중돼야 한다’는 표현이면 어땠을까.” 이제는 완전히 다른 입장에 선 목소리였다. 한편에선 본부 직원들에게 “학생 기자들에게 정보를 숨기려 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제공할 수 있는 내용들은 공유하라”고 당부하며 대학주보 가치를 존중하고자 했다.
해직 기자에서 신문방송학과 교수로, 대학주보 주간을 거쳐 총장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굽이진 길을 돌아본 한 교수는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이 걸어온 길을 성찰하는 시간이다”라고 말했다. 학생기자들에게는 “이번 주엔 어떤 취재를 했는지, 기자로서 최선을 다했는지, 관련 인물들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지, 다음엔 더 나은 방식으로 써보자는 다짐도 필요하다”는 조언을 건넸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1
- 2
- 3
- 4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