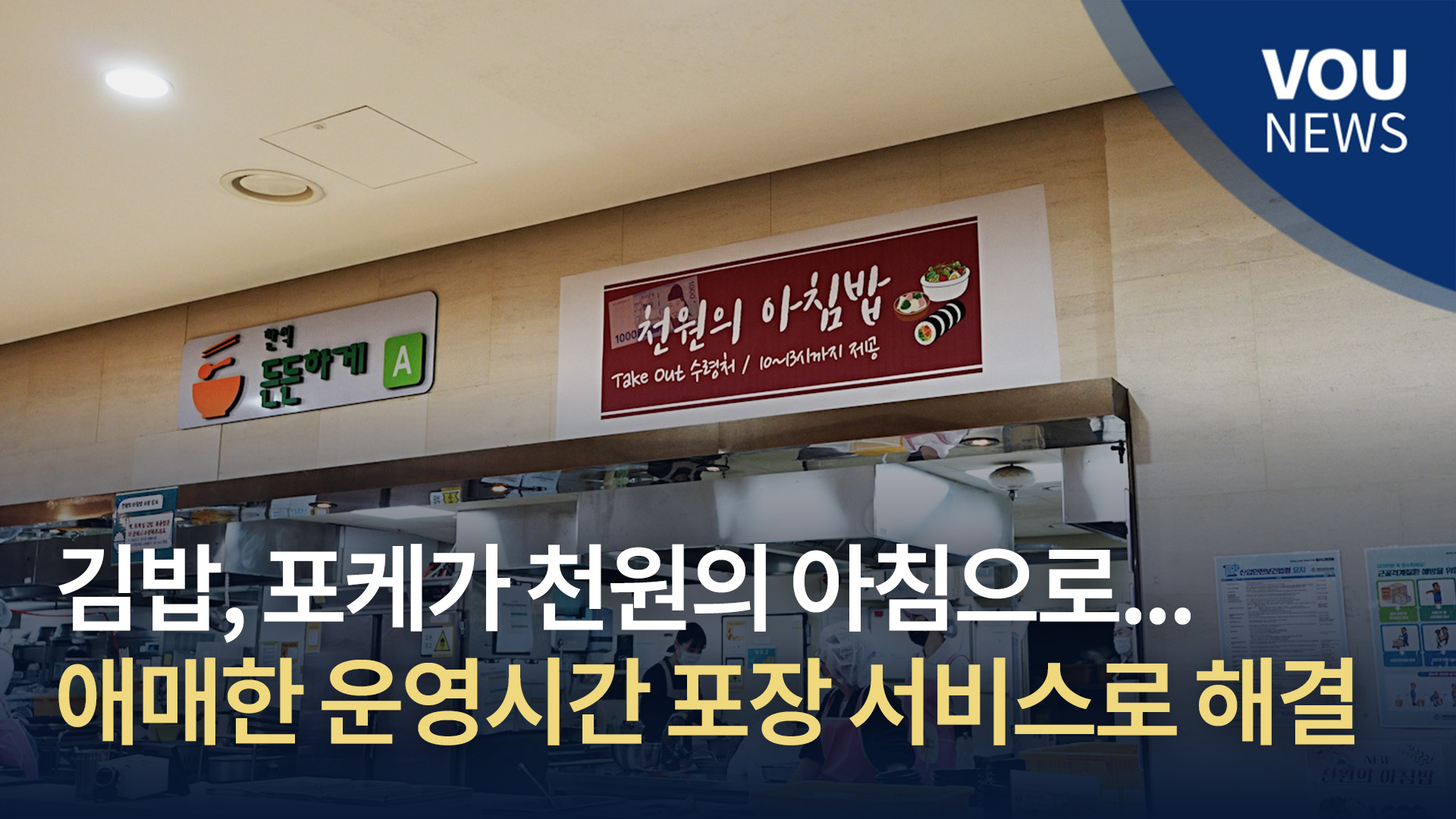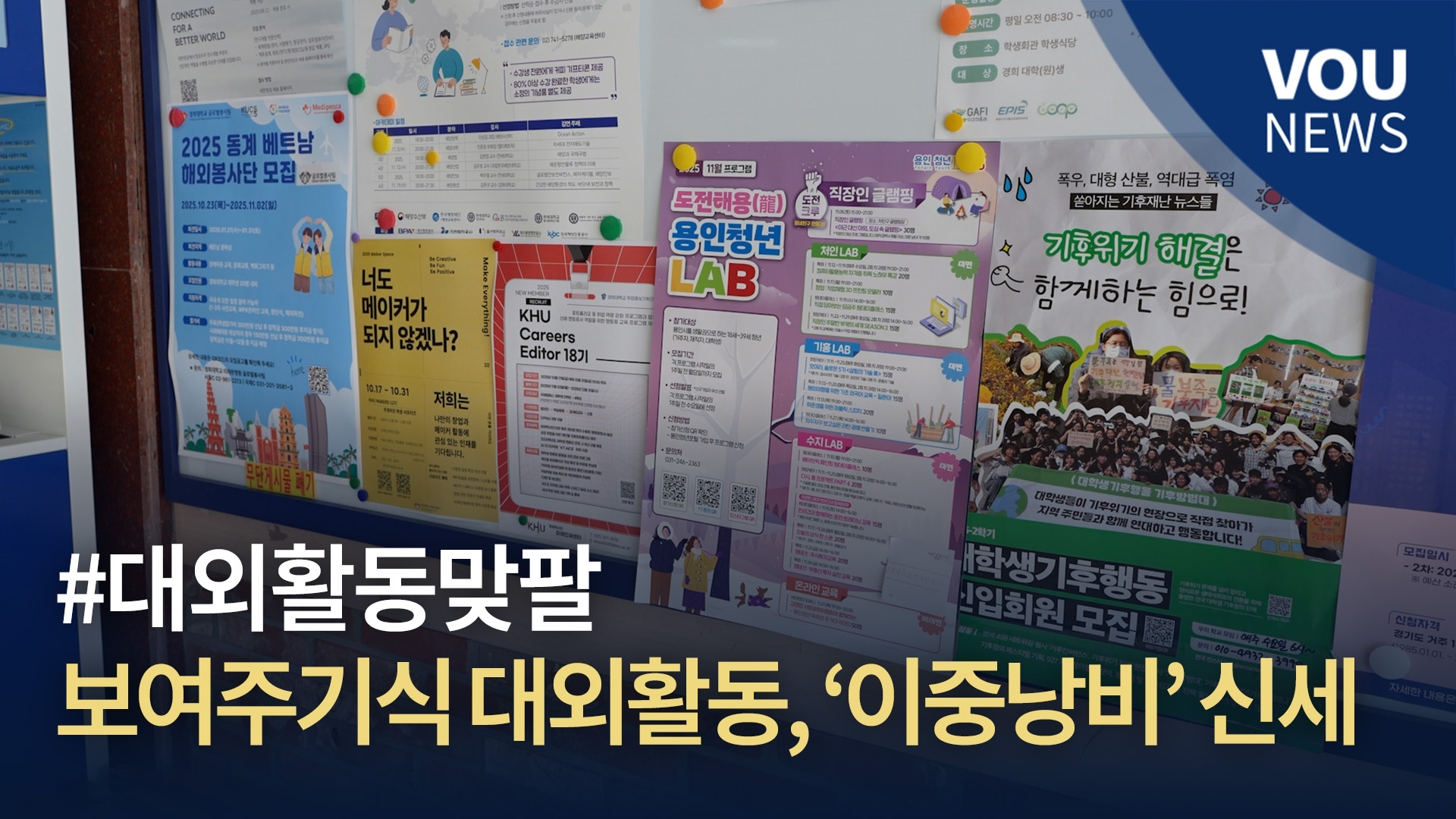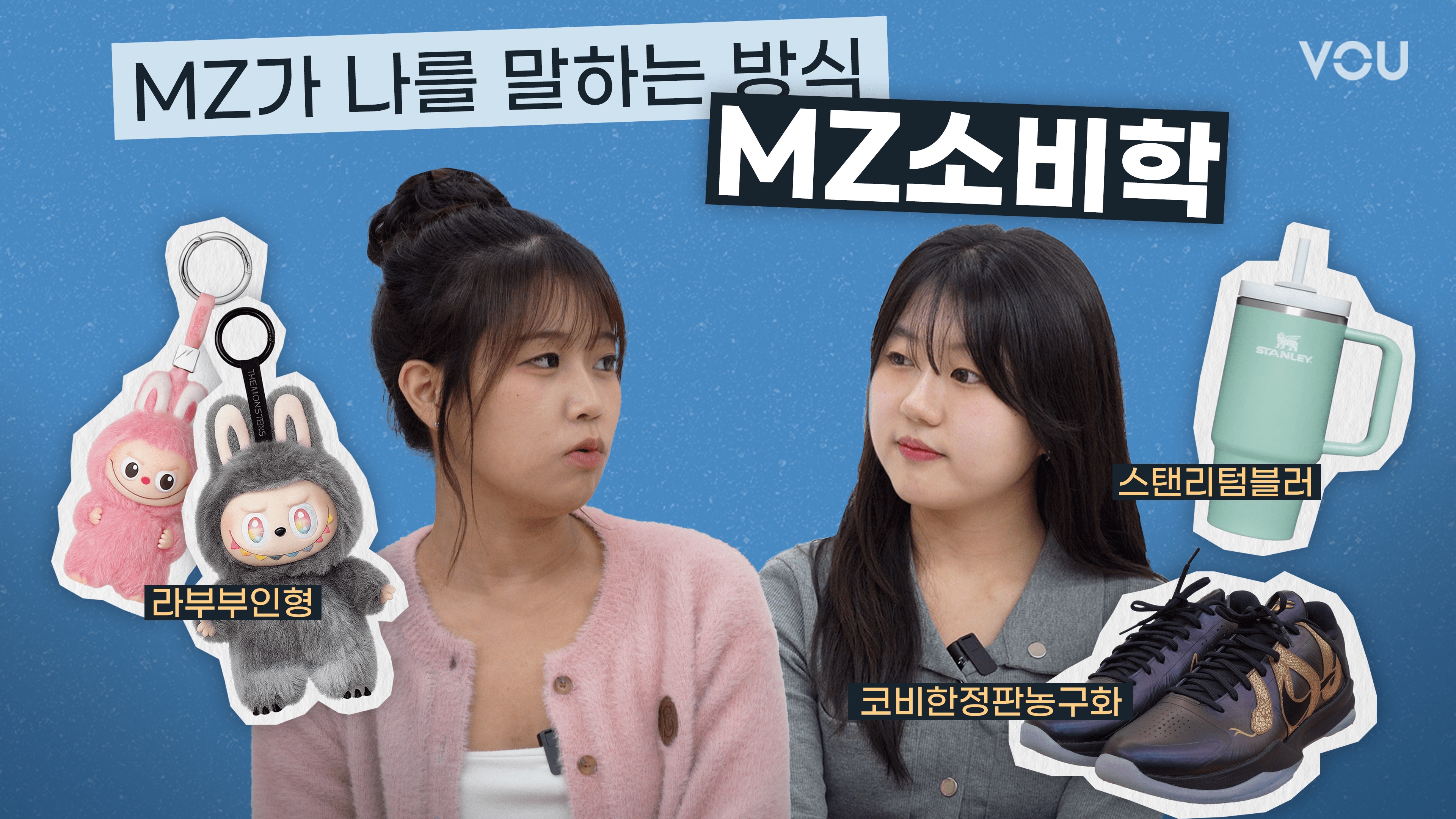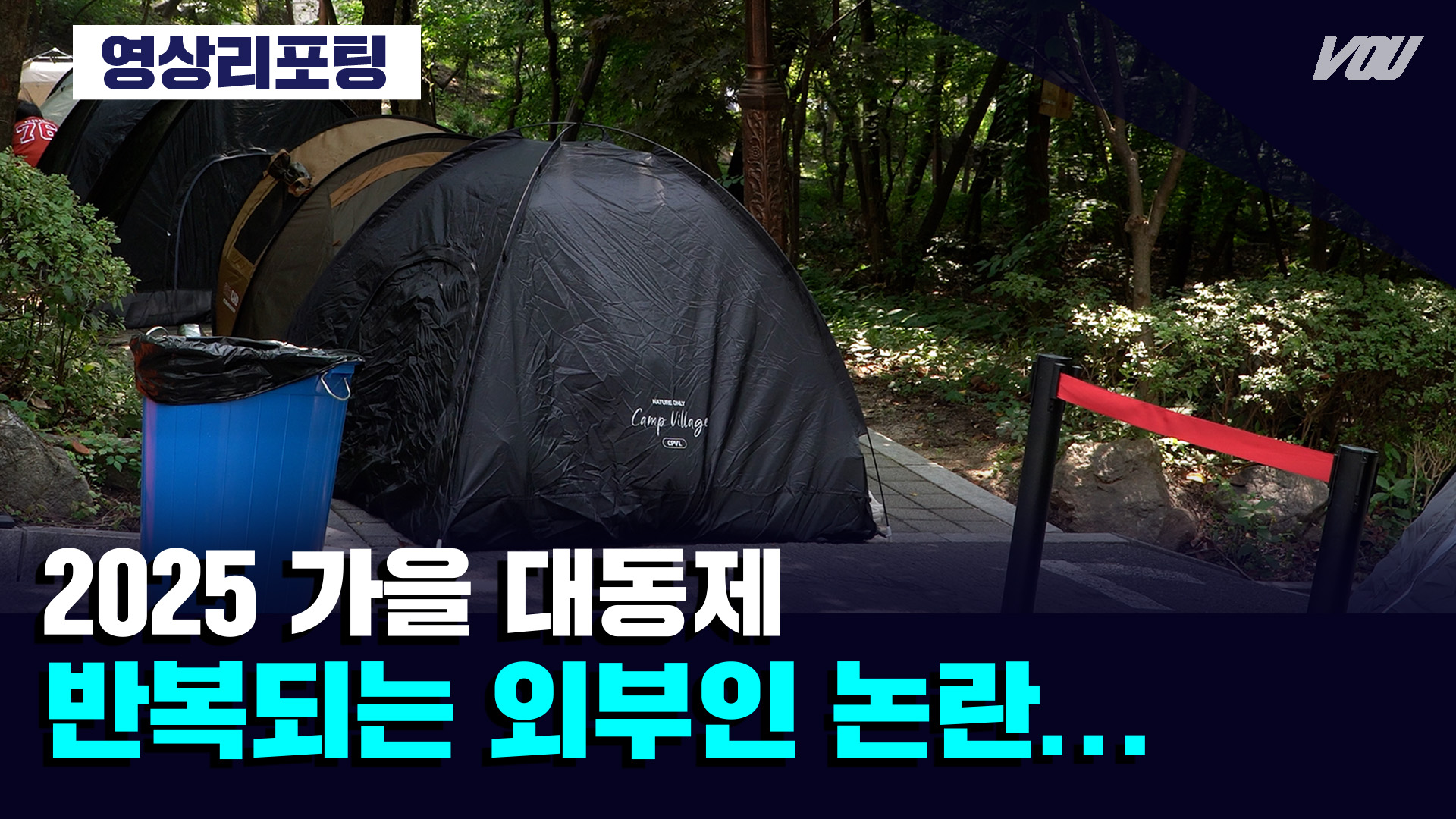[시사/교양] 언어로만 들어갈 수 있는 또 다른 세계 | [당신이 놓친 세계]
언어로만 들어갈 수 있는 또 다른 세계 | [당신이 놓친 세계]
AI가 언어 장벽을 허물어가는 시대, 외국어 학습은 과연 여전히 필요한 일일까요? 언어는 단순히 의사소통의 수단을 넘어, 한 사회가 수천 년 동안 쌓아온 사고방식과 세계관을 담고 있습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순간, 우리는 또 다른 인지 환경을 경험하며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힘을 얻게 됩니다. 지금, 언어가 열어주는 또 다른 세계를 함께 만나보세요.
기획 홍지원 | hziione@khu.ac.kr
편집 홍지원 나하린 / 진행 이소정 / 출연 권수현 교수 박찬욱 교수 정원석 교수 / 구성 VOU
[영상 전문]
[학생1]
"외국어 공부를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게 요즘은 AI가 알아서 번역해주고 말을 해주니까 영어 공부를 하는게 의미가 있나..."
[학생2]
"영어를 공부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 같아서..."
[학생3]
"여름에 유럽 여행을 다녀왔는데 항상 AI 번역기를 들고 이렇게 대화를 하니까 사실 언어적인 문제를 느낀 적은 없어서 외국어 공부를 해야 할까?"
AI가 모든 것을 번역해 주는 시대, 그렇다면 외국어 공부는 더 이상 필요 없는 걸까요? 언어는 단순히 '번역'만으로 충분할까요? 여기에 흥미로운 실험 하나가 있습니다.
2001년 스탠포드 연구진은 두 유학생에게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서있는 곳이 오늘이라면 어제는 어느 방향인가요? 중화권 유학생들은 '뒤쪽'을 영미권 유학생들은 '왼쪽'을 가리켰습니다. 놀랍게도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레라 보로디츠키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모국어가 중국어인 화자들이 과거를 뒤쪽이라고 말할 확률이 무려 네 배나 높았다고 하는데요. 같은 질문인데도 왜 다른 답이 나올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쓰는 언어가 사고방식에 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영어는 시간을 가로방향으로 표현합니다. Next week, Last month처럼 앞뒤로 말이죠.
반면, 중국어는 시간을 세로 방향으로 표현합니다. '샹조우'는 지난 주, '시야조우'는 다음 주를 의미하며 위아래 개념으로 시간을 인식합니다. 즉 반복된 어휘의 사용으로 인해 단순히 그 어휘를 넘어 시간이라는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으로까지 언어의 영향으로 확대된 것이죠.
이는 언어 상대성 가설로 알려져 있습니다. 언어가 단순한 의사소통 수단을 넘어 우리의 사고방식과 인지 과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이죠. 언어권마다 다른 색채 개념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러시아어에서는 파란색을 두 가지로 엄격하게 구분합니다. 밝은 파란색은 Goluboy, 짙은 파란색은 Siniy라고 부르죠. 반면 영어권에서는 이 모든 색을 Blue 하나로 표현합니다. 2007년 PNAS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러시아어 화자들의 파란색 구별 능력이 영어 화자들보다 훨씬 뛰어났습니다. 파란색 계열의 색을 구별하는 과제에서 러시아 화자들은 골루보이와 시니 범주에 걸쳐있는 색들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구별해냈죠.
이를 통해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 자체가 언어에 따라 달라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어를 베운다는 것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요?
유튜버 타일러가 흥미로운 비유를 제시했습니다. 바로 언어학습을 수영에 비유한 것이죠. 처음 바다를 마주한 사람은 신기한 마음에 발을 살짝 담그죠. 이것이 언어 학습의 초급 단계입니다. 언어와 친해지는 물놀이 과정으로 간단한 인사말과 기초 문법을 배우며 재미를 느끼는 시기입니다. 중급에 이르면 어느 정도 자유롭게 헤엄칠 수 있게 됩니다. 마치 스노클링하듯 여행지에서 현지인들과 대화하고 그들의 음식과 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죠.
하지만 바로 이 시점에서 예상치 못한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복잡해지는 문법 끝없이 늘어나는 어휘 때문에 공부가 점점 버겁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초급 때 느꼈던 그 재미와 성취감은 사라지고 과연 내가 제대로 공부하고 있는 건지 자신을 의심하게 되는 정체기를 맞게 되죠.
그런데 진짜 언어의 힘은 고급의 단계에 도달할 때 나타납니다. 심해로 스쿠버 다이빙하는 것과 같죠. 어느 순간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이 순간이 그 언어의 고유한 사고방식과 세계관을 몸소 느끼기 시작하는 때죠.
[귄수현 교수/경희대학교 글로벌커뮤니케이션 학부]
"언어학계에서는 이를 인지 환경이라고 부르는데요. 인지 환경이란 사람이 자신을 둘러싼 세상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는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는 언어를 통해서 이런 인지 환경을 만들어가게 되는데요. 과거 신성 로마제국의 황제 카롤루스 대제가 '제2 언어를 갖는 것은 제2의 영혼을 갖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과 상통하는 말이죠."
문제는 이런 언어의 놀라움을 경험하지 못한 이들에게는 그 가치를 설명하기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심해에서 신비로운 생물을 발견한 감동을 해변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과 공유하기 쉽지 않은 것처럼 말이죠.
[정원석 교수/경희대학교 스페인어학과]
"타인과 어떤 마음을, 사고를 나누는 관계를 형성한다는 게 언어를 배우는 진정한 의미가 아닐까... 단순한 의사소통을 넘어서, 어떤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넘어서, 나와 타인과의 어떤 감정을 공유하고 배우는 그런 과정이 언어 학습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언어는 한 문화권이 수천 년간 축적해 온 사고방식이자 세계관입니다. 따라서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단순히 새로운 의사소통 수단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하나 더 가지게 되는 것이죠.
[박찬욱 교수/경희대학교 중국어학과]
"인간의 언어는 단지 사람들에게 정보만 주는 것이 아니라 감정까지 함께 실어낸다는 측면에서는 근본적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제 전공인 중국어는 예를 들어 '수고하셨어요'라는 말, '싱쿨러'라는 말을 영어로 옮기게 되면 'You have a worked hard.'라는 말로 번역이 된다고 합니다.'열심히 일하셨습니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수고했다는 말, 그 안에는 사람에 대한 위안도 있을 수 있고요. 그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에 대한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의 공감이라고 하는 감정이 실려 있기도 합니다."
"단지 '일을 열심히 했다'는 그 자체를 인정하는 것에서 그치는 말이 아닙니다. 이러한 말들이 다른 문화로 넘어갔을 때는 그게 온전히 실현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보 중심의 언어생활과 정보와 감정이 함께 실린 언어생활이 어떻게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는지..."
[귄수현 교수/경희대학교 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부]
"하지만 AI와 아주 심도 깊은 학술적인 대화를 나누는 데는 여전히 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에서 본인이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이나 어떤 주제나 어떤 프로젝트, 예를 들어 특정한 주제에 대해 자신이 학술적으로 연구한 부분을 영어로 발표하며 조금 더 고차원적인 교육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AI가 아무리 발달해도 언어적 사고력과 문화적 통찰력은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한 영역입니다. 여러분도 새로운 언어를 통해 또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1
- 2
- 3
- 4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