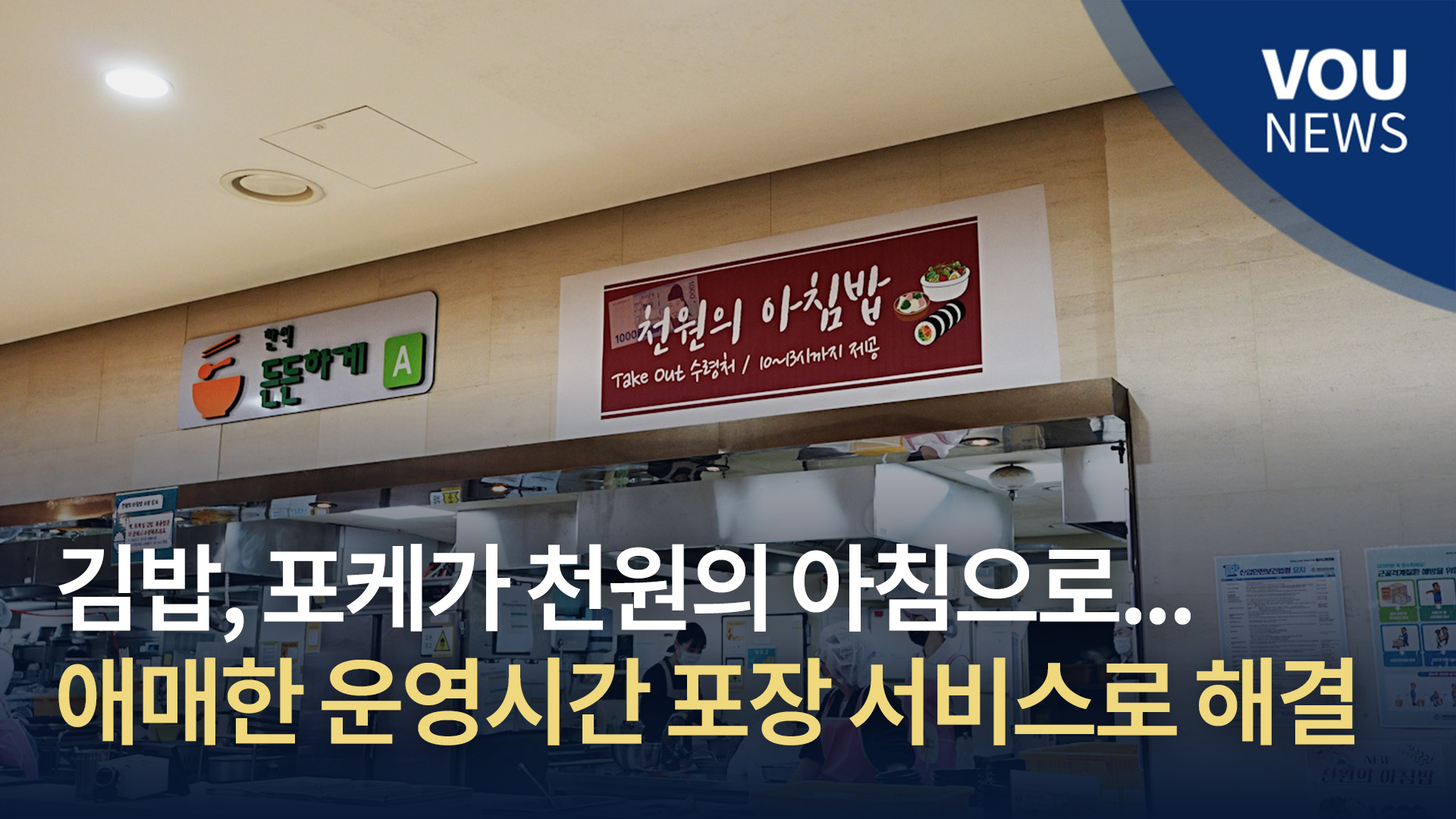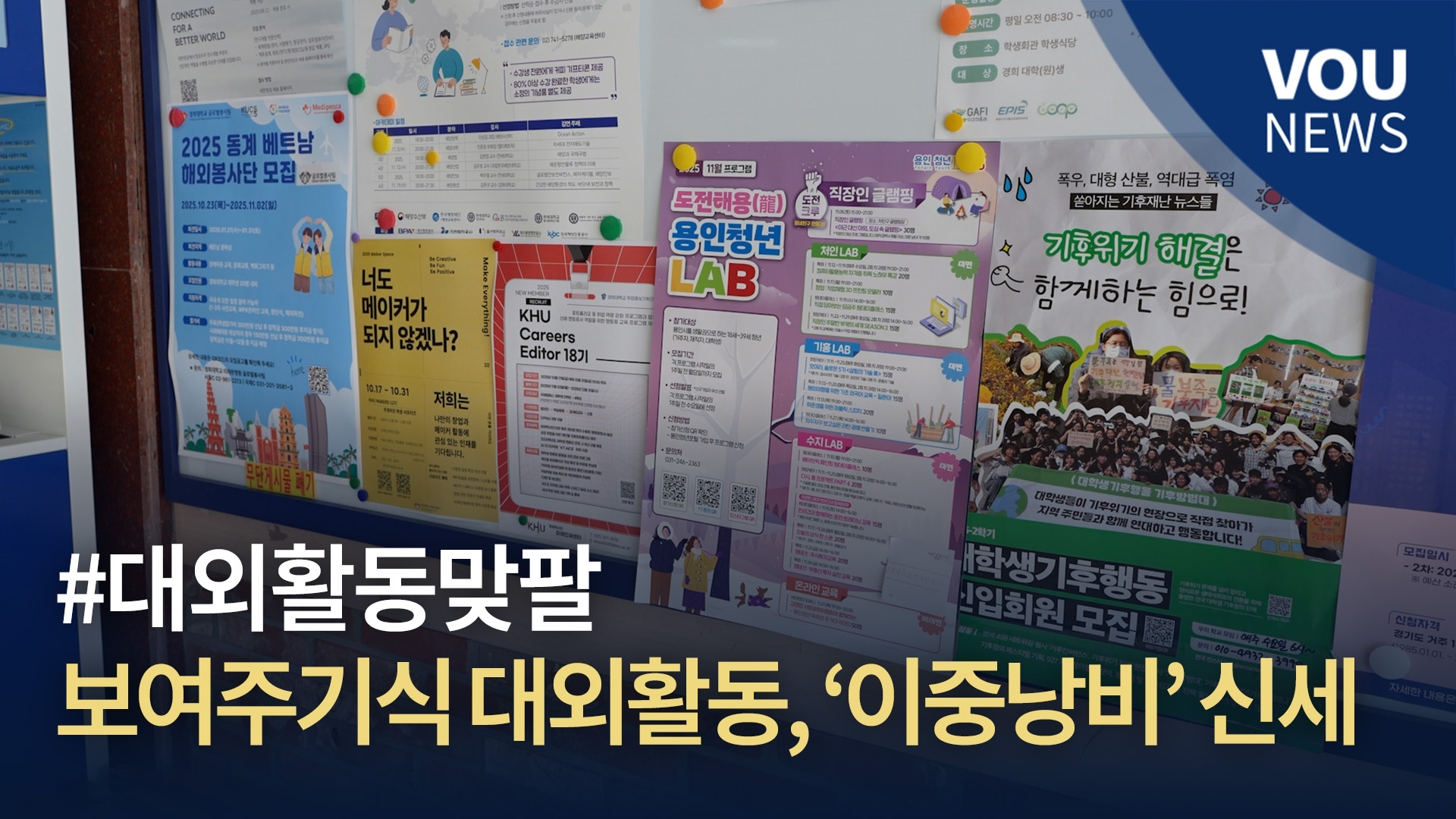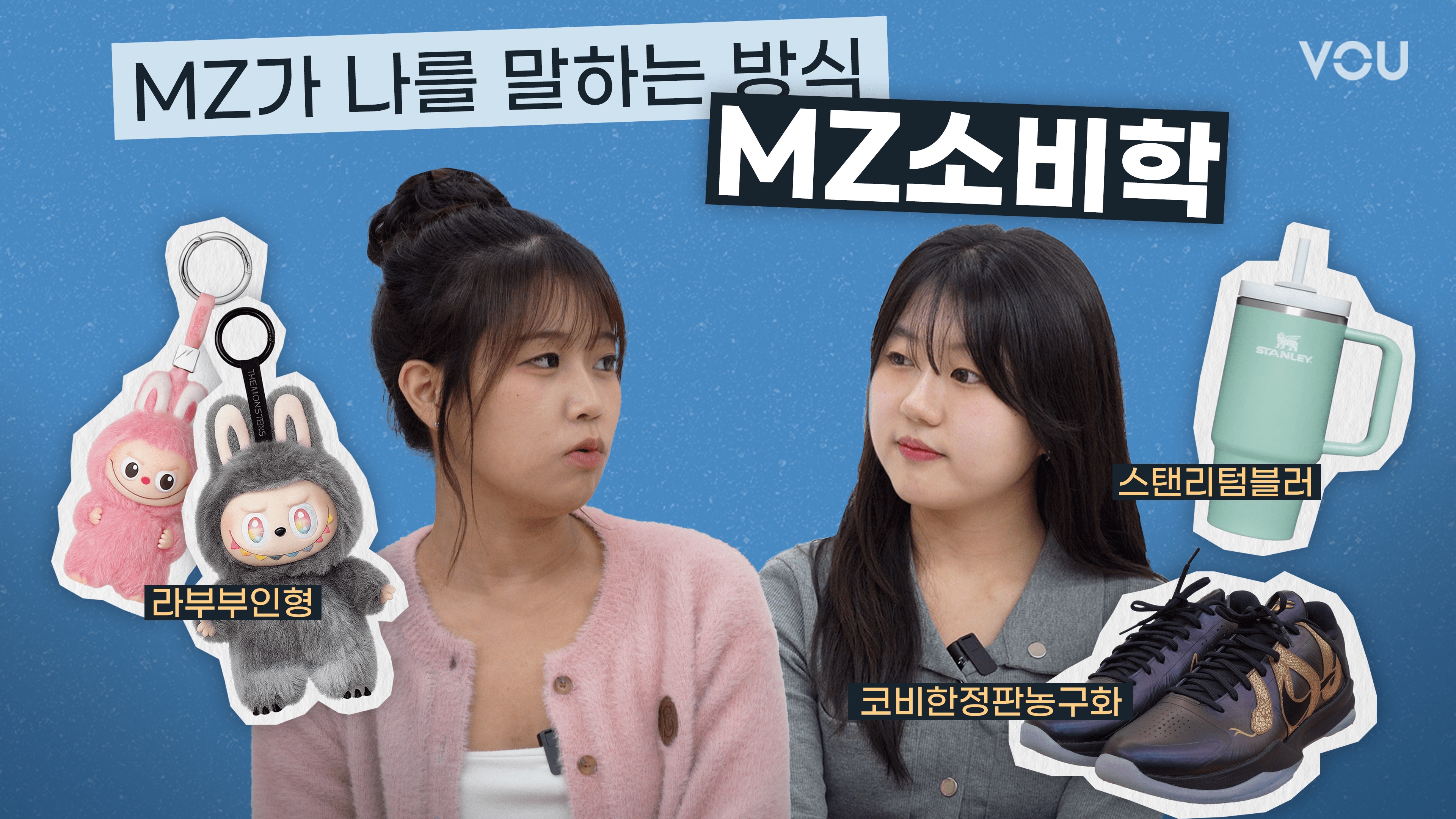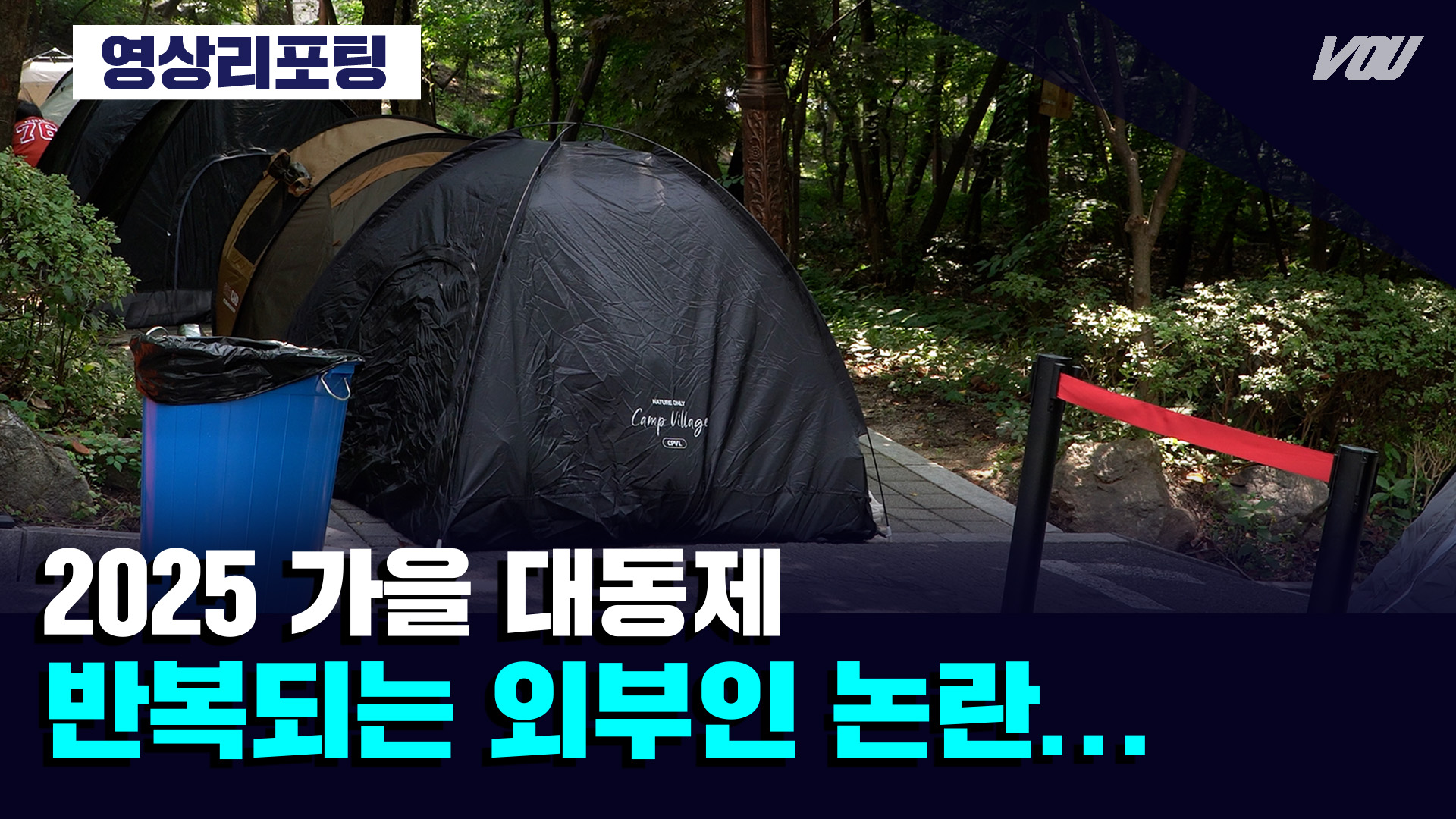[시사/교양] 주제는 떠오르는 게 아니라, 발견하는 것 | [주제선정]
주제는 떠오르는 게 아니라, 발견하는 것 | [주제선정]
우리는 왜 주제 선정이 늘 어려울까요? 그 이유는 주제를 ‘저절로 떠오르는 것’이라 믿고, 그냥 기다리기만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제는 갑자기 번쩍 떠오르는 게 아닙니다. 주제는 ‘발견’해야 합니다. 막막한 아이디어도, 흐릿한 생각도 발견의 과정을 거치면 구체적이고 매력적인 주제가 됩니다. 레포트, 발표, 연구, 그리고 인생의 중요한 선택까지… 모두 “떠오르는 게 아니라, 발견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기획 나하린 | harin0518@khu.ac.kr
진행 김다희 / 편집 나하린 홍지원 / 출연 김아인 / 구성 VOU
[영상 전문]
여러분, 방금 장면. 낯설지 않으시죠? 사실 주제 선정은 대학 과제에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글쓰기, 연구, 예술, 심지어 인생의 중요한 선택까지... 모두 주제를 발견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주제 선정은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많은 분이 주제를 ‘갑자기 번뜩 떠오르는 아이디어’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핵심은 이겁니다. 주제는 떠오르는 게 아니라,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제를 못 찾는 이유는 단순히 기다리기만 하기 때문이죠. 직접 나서야만, 주제가 보이는 겁니다.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주제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딱 네 가지 전략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낯설게 보기’입니다. 익숙한 공간이나 사물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면, 새로운 주제를 발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편의점. 단순한 가게일까요? 아니죠. 편의점은 ‘대학생의 삶을 지탱하는 생활 인프라’라는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카페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커피를 마시는 공간이 아니라, 요즘 흔히 말하는 ‘카공족’ 문화처럼, ‘대학생의 학습 문화를 보여주는 제2의 강의실’이란 주제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커다란 원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 원 안에는 ‘환경 문제’, ‘취업 문제’처럼 거대한 주제들이 들어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크기만 커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죠.
그런데 이렇게 범위를 좁혀보면 어떨까요? ‘환경 문제’ 대신 ‘캠퍼스 일회용 컵 문제’, ‘취업문제’ 대신 ‘인문계 졸업생이 공기업을 선택하는 이유’. 이제야 훨씬 구체적이고 탐구할 수 있는 주제가 됐죠.
이처럼 범위를 조절하는 순간, 막연했던 큰 이슈도 실제로 와닿는 주제로 바뀌는 겁니다.
세 번째 전략은 ‘A와 B를 연결해 보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것들을 묶으면, 거기서 새로운 주제가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 AI와 글쓰기를 합친다면 ‘AI 시대의 대학생 글쓰기’라는 주제가 나오고, K-pop과 환경을 결합하면 ‘K-pop 팬덤이 만든 친환경 캠페인’이라는 주제가 될 수 있죠. 이처럼 연결하기 전략은 서로 다른 영역이 만나는 지점에서 새로운 주제를 발견하게 합니다.
마지막 전략은 ‘시사성과 개인성의 결합’입니다. 사회적 이슈와 나의 경험을 연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요즘 우리 사회의 큰 화두, 바로 저출산 문제가 있죠. 그런데 단순히 ‘출산율이 낮다’는 뉴스로만 접근하면 너무 추상적이에요. 여기서 만약 내가 외동으로 자라난 경험을 더한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외동 세대의 시선에서 본 저출산 사회’라는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훨씬 구체적이고, 나만의 시각이 담기죠.
즉, 시사성과 개인의 경험을 합치면, 거대한 사회 담론도 나만의 문제의식으로 풀어낼 수 있는 주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네 가지 전략은 사실 과제에만 쓰이는 게 아닙니다. 동아리 공연 기획, 영상 제작, 졸업 전시... 모든 일은 주제를 정하는 순간부터 시작돼요. 그냥 ‘음악회’라고 하면 막막하기만 한 공연 준비도 ‘MZ세대가 공감하는 추억의 드라마 OST 콘서트’라고 하면 훨씬 선명해집니다.
영상 콘텐츠도 똑같아요. ‘학교생활’을 찍겠다? 이건 막연해요. 그런데 ‘시험기간 도서관의 풍경’이라고 주제를 정하는 순간부터는 달라집니다. 카메라에 담을 컷이 보이고, 소리나 분위기까지 구체적으로 떠오르죠. 여기서 바로 ‘영감’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감은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주제를 잡는 순간부터 따라오는 과정인 거예요.
창의성 연구자인 그레이엄 월러스(Graham Wallas)도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창의적 사고는 네 단계로 이뤄진다고 했죠. ‘준비 – 숙성 – 발현 – 검증’.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 떠올랐다!’ 하는 영감의 순간이 바로 발현 단계인데요. 이것도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반드시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즉, 주제를 정하고 관찰하고 자료를 모으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거죠.
주제가 없으면 초점도 없습니다. 초점이 없으면 관찰도, 연결도 이어지지 않죠. 결국 영감조차도 주제를 찾는 순간부터 파생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분명해졌죠? 주제는 갑자기 떠오르는 번뜩임이 아니라, 찾고, 관찰하고, 연결하는 과정에서 발견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제를 찾는 일은 단순한 과제 준비가 아니라, 영감을 여는 시작점이고, 더 넓은 사고로 나아가는 출발선이죠.
좋은 주제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관점을 조금만 달리하면, 바로 곁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1
- 2
- 3
- 4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