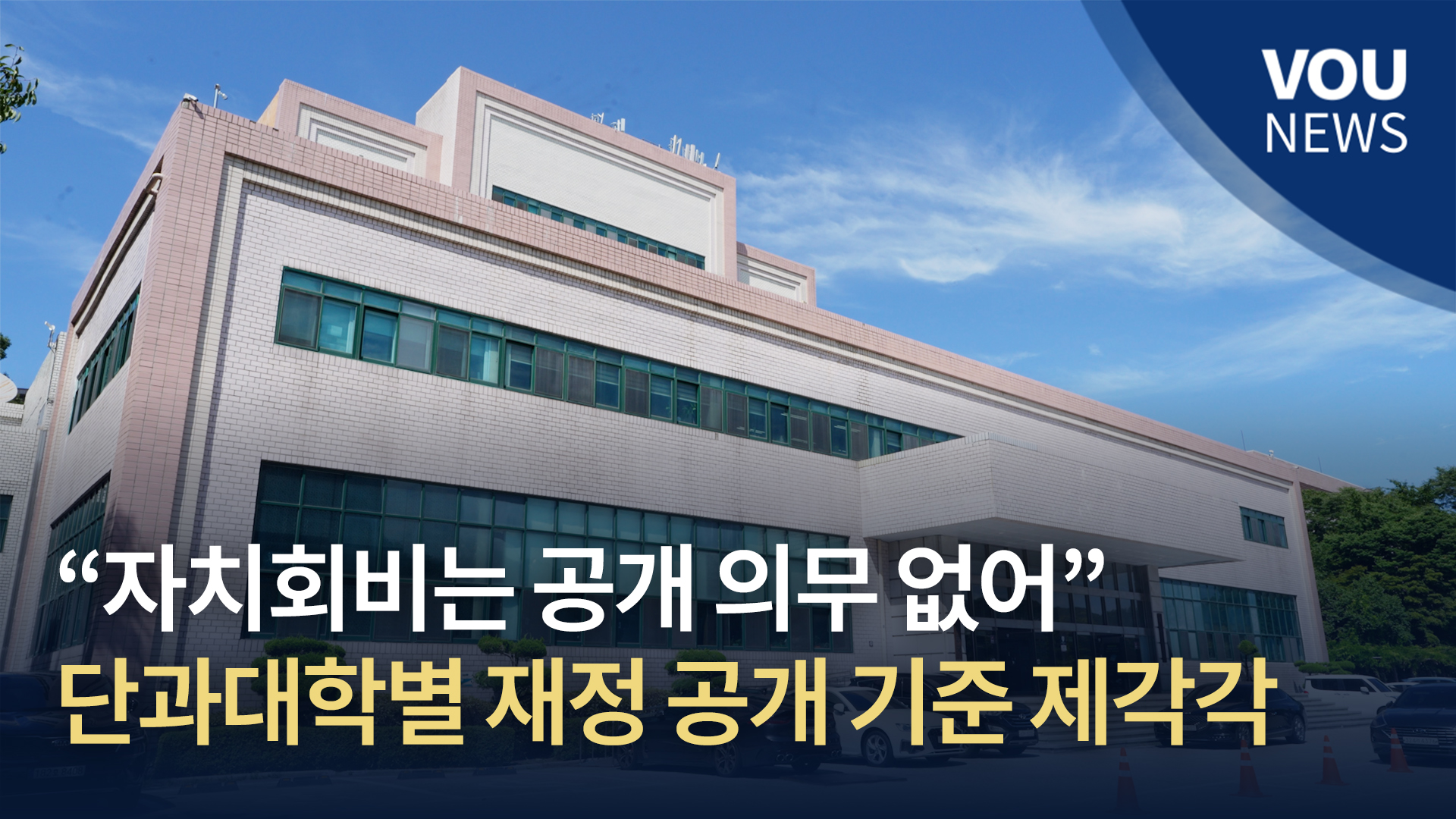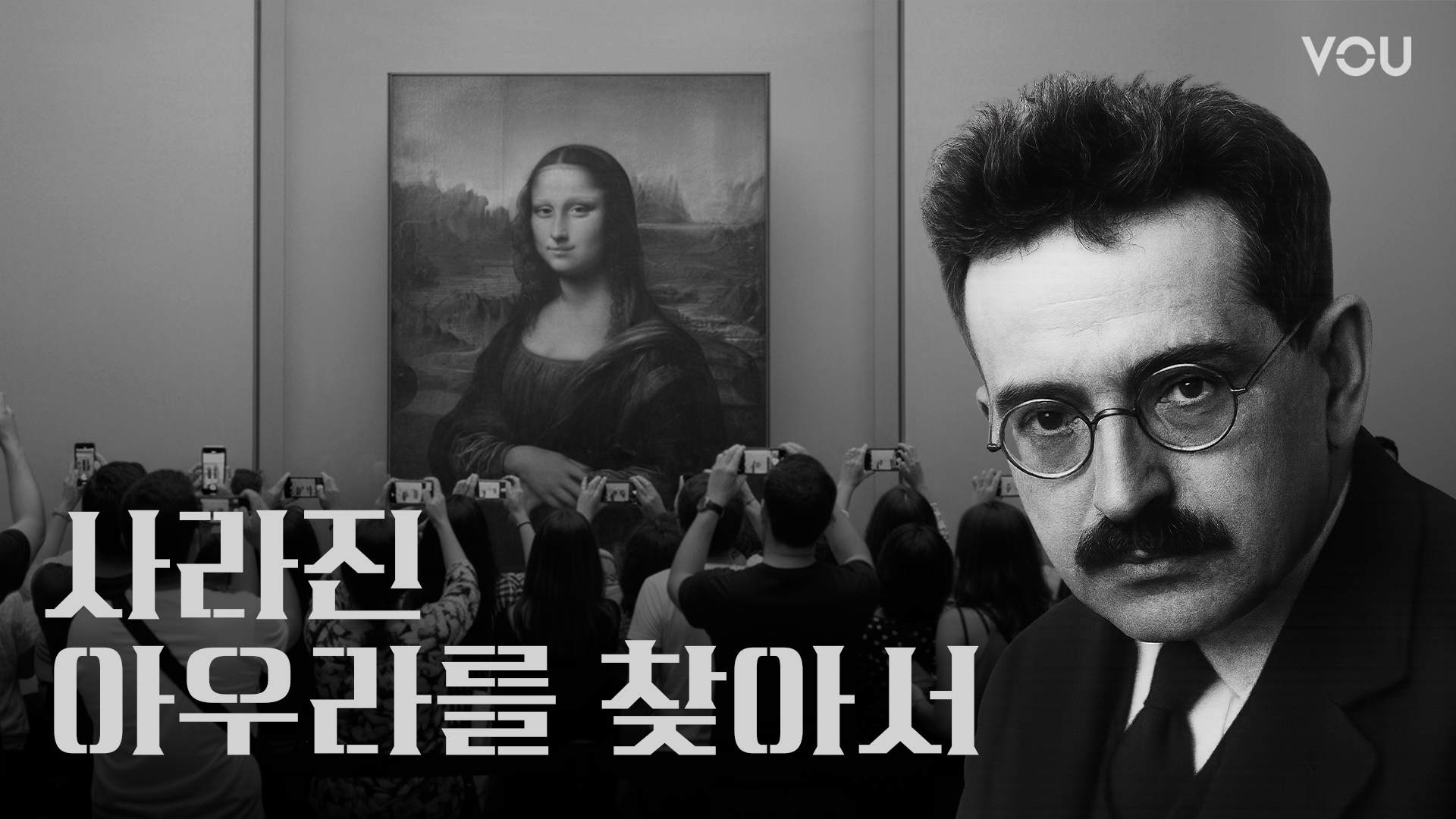[시사/교양] 우리는 무엇을 보고 느끼는가 | [사라진 아우라를 찾아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느끼는가 | [사라진 아우라를 찾아서]
우리는 흔히 “예술은 경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진과 영화가 등장하던 100년 전에도, 사람들은 원본과 복제의 차이를 고민했습니다. 벤야민은 그 차이를 ‘아우라’라 불렀고, 원본만이 지닌 현존감을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디지털과 AI 시대 속에서 진정한 예술 경험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요?
기획 신희재 | tlsgmlwo58@khu.ac.kr
진행 김다희 / 편집 신희재 나하린 / 구성 VOU
[영상 전문]
예술을 본다는 건,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과거엔 예술 작품을 보기 위해선 꼭 미술관에 가야 했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원본’이었고, 그 앞에 선다는 것만으로도 특별한 경험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기술이 워낙 발전해서 손안의 작은 화면으로 웬만한 작품은 다 볼 수 있게 됐어요. 클릭 몇 번이면 전 세계의 예술이 눈 앞에 펼쳐지죠.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예술 작품을 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단지 그 흔적만 보고 있는 걸까요?
사실 이 질문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사진과 영화가 처음 생겼을 때도, 사람들은 똑같은 고민을 했죠. 20세기 초, 사진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예술 작품을 그대로 복제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한 장의 그림이 수백, 수천 장의 사진으로 찍혀 세상에 퍼져 나갔죠.
그 무렵, 독일의 철학자 발터 벤야민이 <기술복제시대의 예술작품>이라는 글을 발표합니다. 기술이 예술을 무한히 복제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예술은 무엇을 잃게 될까요? 벤야민은 그 답으로 ‘아우라(Aura)’를 말했습니다.
‘아우라’란 작품이 놓여있는 그 시간, 그 공간에서만 느낄 수 있는 고유한 분위기를 말합니다. 원본만이 가지는 특별한 느낌이자, 그 앞에 섰을 때 전해지는 묘한 현존감이죠. 그래서일까요. 우리가 여전히 미술관을 찾는 건, 그 ‘아우라’를 직접 느껴보고 싶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벤야민은 사진에 이어 등장한 영화라는 매체에도 주목했습니다. 그는 영화가 관객을 ‘산만하게 만든다’고 말했죠. 그림 앞에 서서 오랜 시간 집중하며 사색하던 과거와 달리, 영화는 빠르게 바뀌는 이미지들로 우리의 시선을 끊임없이 흔들어 놓습니다.
하지만 벤야민은 이런 ‘산만함’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관객이 영화를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준다고 봤죠. 빠르게 전환되는 장면 속에서도, 관객이 주체적으로 의미를 찾아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00년이 지난 지금, 이 ‘산만함’은 더욱 강한 형태로 우리 일상에 스며들었습니다. 바로 스마트폰 속 영상 문화예요. 불과 10초 남짓한 숏폼 콘텐츠가 넘쳐나고, 사람들은 한 영상이 끝나기도 전에 다음 영상으로 넘겨버립니다.
짧고 빠른 전환 속에서 우리의 집중력은 더 쉽게 흩어지고, 차분히 생각할 틈조차 사라져 버렸죠. 영화에서 시작된 그 ‘산만함’은 이제 우리의 사고방식과 시선 자체를 흔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강재호 교수는 책 ‘발터 베냐민과 미디어’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디어 비판은 오늘날 우리 세계에서 자신이 있어야 할 장소를 발견하게 해준다”, "베냐민의 도움으로 우리는 이런 현실에 눈뜰 수 있다”고 말이죠.
이제는 누구나 프롬프트 몇 줄만 입력하면 예술가가 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AI가 단 몇 초 만에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만들고, 영상까지 만들어내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보는 예술들은 모두 아우라를 잃어버린 걸까요?
오히려 새로운 형태로 확장되고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개념이 바로 ‘매체 아우라’예요. 이건 미디어 이론가 새뮤엘 웨버가 제시한 건데요. 그는 벤야민과 달리 "멀리 있는 것이 매체를 통해 가까이 다가올 때 그 자체로 새로운 아우라가 만들어진다"고 말했습니다.
또 디지털 시대의 아우라를 새롭게 해석한 <Flexible Aura>전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이 전시는 전통적인 아우라의 개념이 시대에 맞게 더 능동적이고 유연하게 변해야 한다고 말하죠.
예를 들어, 스톡홀름의 예술 듀오 Goldin+Senneby의 <After Microsoft>가 전시됐는데요. 이 작품은 윈도우의 기본 배경 이미지 <Bliss>의 실제 장소를 찾아가 그 풍경을 다시 촬영하는 작업입니다. 수십억대의 컴퓨터 화면 속에 복제된 이미지를 다시 물리적 경험으로 되살려, 새로운 형태의 아우라를 만들어낸 거죠.
발터 벤야민은 100년 전, 기술이 예술을 어떻게 바꿔놓을지를 물었습니다. 그가 보았던 건 사진과 영화였지만, 오늘날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한 디지털 세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화면 속에서 보는 예술 작품들, 그건 정말 아우라를 잃어버린 걸까요? 아니면 새로운 형태의 아우라를 만들어내고 있는 걸까요?
답은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손안의 화면을 빠르게 넘기며 콘텐츠를 소비할 수도 있고, 그 속에서 잠시 멈춰 무엇을 진짜로 경험할지 스스로 선택할 수도 있죠.
복제된 세계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무언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기술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통해 무엇을 보고, 어떻게 느끼느냐’ 입니다. 당신은 오늘 무엇을 보았나요? 그리고 정말로 보았나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1
- 2